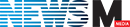미국 경기가 침체상태로 진입한 것 아니냐는 경제지표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구매관리자지수가 예상보다 부진한데다 건설투자도 전월 대비 감소했다. 결정적으로 비농업 신규 일자리 등 고용지표가 둔화되는 기색이 역력하다. 미국의 내수를 지탱하는 고용시장이 불안하다는 건 예사롭지 않은 신호다. 세계경제의 엔진이자 윤석열 정권의 반중(反中) 기조 이후 대한민국의 주요 수출시장이 된 미국이 경기침체에 빠진다는 건 대한민국에도 악재일 수 밖에 없다.
미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와 건설투자의 동반 부진
CNBC방송·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가 발표한 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7.2를 기록해, 5개월 연속 수축 국면에 머물렀다. 이는 전월(46.8)보다는 소폭 개선된 것이지만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47.9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다. 제조업 PMI는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50보다 낮으면 위축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신규 주문 지수는 전월(47.4)보다 낮은 44.6을 기록했고 생산 지수는 전월(45.9)보다 낮은 44.8로 2020년 5월 이후 가장 낮았다. 화물운임 상승 등의 여파로 투입비용 관련 지수는 전월 52.9보다 오른 54.0이었다.
또한 7월 건설투자가 전월 대비 0.3% 줄어들었다는 미 상무부 인구조사국의 발표도 있었다.

미국 경제를 이끌던 고용이 둔화되는 기미가 뚜렷해
미국경제는 민간소비가 엔진이다. 그 민간소비를 지탱하는 것이 바로 고용이다. 그런데 미국의 내수를 지탱하는 고용지표도 불안하기만 하다. 8월 18∼24일 기준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8월 11∼17일 주간 186만 8000건으로 직전 주보다 1만 3000건 증가했다.
또한 비농업 일자리 증가세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미 노동부는 8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4만2천명 증가했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7월 고용 증가 폭은 종전 발표 때의 11만4천명에서 8만9천명으로 대폭 하향 조정됐다. 8월 고용 증가 폭은 7월보다는 커지긴 했지만 직전 12개월간 평균 증가폭(20만2천명)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6만1천명)도 밑돌았다. 7월에 이어 8월도 고용 약화가 어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날 함께 발표한 8월 실업률은 7월(4.3%) 대비 낮아진 4.2%로 나타났다. 8월 실업률은 전문가 예상 수준에도 부합했다. 앞서 발표된 7월 실업률은 2021년 10월(4.5%)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시장의 경기 침체 우려를 키운 바 있다.
예상을 밑돈 8월 고용 상황은 미국의 경기가 식어가고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지속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연준이 오는 17∼18일 통화정책 회의에서 일반적인 0.25%포인트 인하가 아닌 '빅스텝'(0.50%포인트 인하)을 단행할 수 있다는 기대도 키우고 있다.

미국 경제의 엔진이 식는다면 대한민국은?
미국의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건 대한민국 입장에서 악재다.
주지하다시피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인 대한민국은 무역이 가장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 줄곧 중국을 도외시하고 미국에 의존해 왔다. 그런 윤 정부의 정책기조는 대중국 및 대미 무역수지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윤 정부 취임 이후 무너진 무역수지의 주원인이 대중국 무역수지의 악화임은 긴 설명이 필요치 않다. 그나마 대미 수출은 양호한 편이었는데 이제 대미 수출조차 여의치 않을 상황에 직면했다.
윤석열 정부가 조만간 닥칠 대미 수출의 곤란을 미리 직시하고 중국과의 전면적 관계개선을 통한 대중국 무역수지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할텐데, 그걸 기대하는 것이 난망이어서 근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