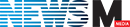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개혁은 놀라울 정도로 자유주의적이다. 그의 방식은 더 이상 진보적 레토릭에만 기대지 않는다. 어쩌면 그의 정치 인생 전체를 가로지르던 '약자 중심'의 철학은 이제, 지속 가능한 시장 질서를 세우는 전략으로 재구성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실제로 선거 과정에서 그는 우클릭을 강조하며 극우화로 무주공산이 되어 버린 보수의 영역에 ‘침탈’했다. 민주당의 이념적 지향을 구좌파로 규정하는 세력들에 의한 비판이 있었으나 유시민 김어준 등의 친명 빅 스피커들의 ‘활약’으로 이재명의 침탈전략은 연착륙했다.

역설적으로, 진정한 시장주의 개혁은 과거 자유주의를 외쳤던 윤석열 정부가 아닌 이재명 정부의 손에서 구현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형식만 자유주의였지, 실제로는 관치와 억압의 유산을 반복했다. 검찰 권력을 앞세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시장의 자율성을 정치적 도구로 삼으며 ‘자유’를 헛소리로 등치시켰다. 결과는 궤멸적이었다. 그 실패를 목격한 유권자들이 이재명을 선택했을 때, 그 기대는 오래된 복지국가의 꿈보다는 새 질서를 향한 현실적 갈망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식 개혁 행보를 지지하면서도 ‘구좌파’에 대한 그리움을 가진 이들이 아직 남아 있다. 그것은 혁명의 실패를 애도하는 상투적 회한이 아니다. 좌파 멜랑콜리(leftist melancholy), 곧 정치적 패배와 이상 상실의 정서가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슬픔과 냉소, 그러나 그 안에서 다시 저항을 가능케 하는 묘한 감정적 에너지다.
좌파 멜랑콜리는 실패한 혁명에 대한 향수가 아니다. 더 나은 세상을 바랐지만 끝내 도달하지 못한 이들이 품는 정서적 유산이다. 자본주의의 맹렬한 속도 속에서 밀려난 이들의 목소리, 수치심과 우울로 변한 분노의 잔재, 그리고 반복된 패배 속에서도 ‘다르게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의 흔적, 우리는 지금 그런 기억을 너무 쉽게 지워버리고 있지 않은지 걱정이다.
좌파 멜랑콜리는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의 작명이다. 벤야민은 과거의 혁명을 실패로만 바라보며 그 실패 자체를 미학화하고, 현실 정치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태도를 ‘멜랑콜리’로 비판했다. 그는 '과거를 애도하는 자'가 아닌 '과거의 불꽃을 다시 붙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좌파 멜랑콜리는 그런 점에서 일종의 딜레마다. 실패한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다시 반복되지만, 그 기억에 매몰되면 현실을 바꿀 힘을 잃는다.
슬라보예 지젝 역시 이 개념을 현대 좌파의 질병처럼 다룬다. 그는 진보진영이 과거 혁명의 신화를 반복적으로 재현하면서, 실제 정치적 실천은 회피하는 경향을 꼬집는다. 실패한 좌파 프로젝트에 집착하면서도,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급진적 결단을 하지 않는 모순된 태도. 지젝은 그것을 "좌파적 냉소" 혹은 "멜랑콜리적 마조히즘"이라 부른다.
하지만 앤 츠베트코비치(Ann Cvetkovich)는 이 좌파 멜랑콜리를 전복적으로 사유한다. 그녀는 <우울: 공적 감정>(박미선, 오수원 옮김, 마티, 2025년)에서 우울과 상실, 멜랑콜리를 개인의 병리가 아닌 정치적 감정(political feeling)으로 본다. 좌절감과 무기력조차 공적인 것이며, 오히려 그 감정 속에 공동체적 연대의 씨앗이 숨어 있다고 말한다. 그녀에게 좌파 멜랑콜리는 '치유해야 할 병'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열기 위한 감정의 아카이브다.
오늘날 이재명의 개혁은 분명 성과 중심에 방점을 찍고 있다. 우리는 그 성공을 기뻐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 개혁의 현장에서 ‘뒤에 남겨진 자’들에 대한 관심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좌파 멜랑콜리는 그런 관심을 잊지 않게 하는 화두다. 모두가 환호하는 이 지점에서 조차 묘한 열패감을 느끼는 자들(극우적 반대자들 말고)의 감정을 외면하지 말고, 그것을 연대의 재료로 삼는 것, 치유가 아닌 공적 감정의 자원으로서의 멜랑콜리, 바로 그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정치의 감수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