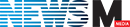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랑스 작가 기욤 뮈소의 ‘구해줘’(윤미연 옮김, 밝은세상)는 사랑 이야기의 틀을 빌리되, 그 안에 삶의 경계와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물음을 담아낸다. 뉴욕이라는 익숙한 도시에서 시작된 낯선 만남은 점차 초월적 차원으로 확장된다. 시작은 현실이지만 끝은 운명과 죽음, 그리고 구원의 서사로 확장된다.
샘 갤러웨이는 타인의 생명을 지켜내는 내과 의사지만 정작 자신은 삶의 의미를 잃은 채 무력하게 살아간다. 어린 시절의 상처는 그의 감정 깊숙한 곳을 굳게 닫아버렸고, 일상은 그저 반복되는 생존에 가까웠던 어느날 프랑스에서 배우의 꿈을 안고 뉴욕에 온 줄리에트 보몽과 조우하며 그의 삶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둘은 빠르게 사랑에 빠지지만, 줄리에트는 자신의 꿈을 위해 뉴욕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공항으로 향한다.
줄리에트가 타고 가던 비행기의 추락 사고가 발생한다. 죽음을 통보받고 삶의 끈마저 놓아버릴 위기에 처한 샘 앞에 며칠 뒤 줄리에트가 살아서 다시 나타난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장르적 경계를 넘어선다. 줄리에트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조차 설명하지 못하고, 현실은 불안정하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독자는 샘과 함께 그 불안정한 현실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이 소설에서 중요한 전환점은, 이 모든 상황의 이면에 ‘누군가의 개입’이 있다는 암시다. 바로 ‘그레이스’라는 신비로운 인물의 등장이다. 시간과 공간, 생과 사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샘과 줄리에트의 운명에 관여하는 초월적 존재, 혹은 신의 대리자로 기능한다. 그녀는 사랑을 시험하며, 인간에게 기적이 허락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책임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상기시킨다.
이 신의 개입은 인간 존재의 자유의지와 충돌하지 않는다. 오히려 뮈소는 신이 인간을 조종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신은 기회의 문을 열 뿐, 그 문을 들어설 것인지는 인간의 선택이라는 철학적 전제를 소설 곳곳에 흩뿌린다. 기적은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치열한 사랑과 감정, 그리고 윤리적 결단을 통해 '얻어내는' 것임을 보여준다.
샘과 친구셰이크의 대화다.
“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게 뭐 없을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신이 존재한다면 정신 나간 전쟁들, 치유 불가한 질병들, 증오심이 극에 달해 벌어지는 온갖 테러들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 “신은 슈퍼맨이 아니야. 너는 자유를 사랑하지? 넌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해. 만약 어떤 절대적인 힘이 너의 삶에 끼어들어 자유의지를 억압하고 행동을 제약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샘은 그 말이 자신에게 아무런 위안도 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어깨를 으쓱했다.
셰이크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인간은 자유의지에 따라 최고가 될 수도 있고, 최악이 될 수도 있어. 자유를 많이 가질수록 선택은 더 복잡해지게 되지. 하지만 인간은 자유에 대한 책임을 신에게 떠넘겨서는 안 돼.”
샘은 줄리에트를 선택하면서, 그를 둘러싼 불확실한 현실과 맞서 싸운다. 그는 결국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며, 줄리에트 역시 온전히 삶으로 복귀한다. 이 소설이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의 교류가 아니라, 존재 전체를 건 결단이다. 그리고 그러한 결단이 있을 때, 신은 개입하고, 기적은 현실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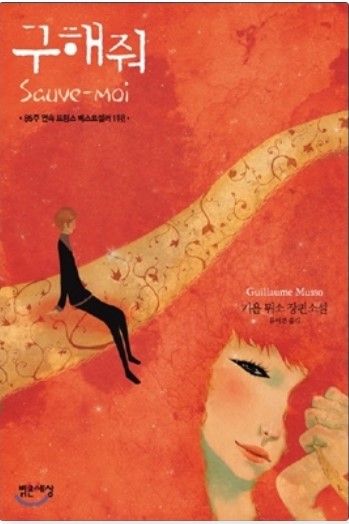
신적 존재인 그레이스는 불교식으로 말하면 이 땅에 아직 풀어야 할 일이 남아 있는 구천을 떠도는 영혼같은 존재다. 그레이스는 전직 경찰이었는데 샘과는 우발적 악연으로 사망했다. 그레이스는 이 악연을 업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숙제로 생각하고 오히려 샘의 사랑을 도운 것이다.
뮈소는 ‘구해줘’를 통해 현실과 초현실, 이성과 감성, 인간과 신의 영역 사이를 넘나들며 독자에게 깊은 울림을 남긴다. "사랑은 기적을 믿게 만든다"는 구절은 이 소설의 감상적 핵심이 아니라 철학적 요약이다. 우리가 사랑을 택하는 순간, 삶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고, 죽음은 단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 된다.
그러나 2025년의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정녕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불신이 일상화되고, 혐오가 제도화되며, 연대는 조롱의 대상이 된 이 사회에서 사랑이란 과연 가능한가. 상대의 고통에 반응하고, 타인을 위해 자신의 안락을 내어줄 수 있는 감정이 살아남기 위해선, 그 감정이 자랄 수 있는 사회적 토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적 토대여야 할 교회는 초월에 대한 조금의 존중이 있는 사람조차 질리게 만들어 버리는 집단이 되어 버렸다.
사랑이 실종된 사회, 누가 우리를 구해줄 것인가?
꼬리를 무는 독서일기 지난 주제 : 언론 자유
꼬리를 무는 독서일기 이번 주제 : 사랑과 계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