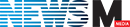윤흥길의 소설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는 서울 빈민을 경기도 광주(廣州- 현재의 성남시 일대)로 강제 이주시키던 1969년~1971년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다. 상하수도를 비롯한 아무런 기반 시설도 없는 그 땅에 버려진 도시빈민들은 1971년 8월 10일 대규모 봉기를 일으켰다. ‘광주대단지 사건’으로 불리던 이 봉기의 명칭은 요즘 ‘성남민권운동’이 되었다. 소설 속 권씨는 "대학 나온 사람"으로 도시 빈민은 아니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광주까지 떠밀려온 사람이었다. 그는 소설 속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는 당시 형편으로는 거금에 해당하는 20만 원을 변통해서 복덕방 영감쟁이를 통하여 철거민의 입주 권리를 손에 넣었다. “난생처음 이십 평짜리 땅덩어리가 내 소유로 떨어진 겁니다.내 차지가 된 그 이십 평이 너무도 대견해서 (중략) 어느 철거민의 소유였어야 할 그것이 협잡으로 나한테 굴러떨어진 줄을 전혀 잊고 지낼 정도였습니다.”
'광주대단지 봉기'가 일어났다. “빗속에서 사람들이 경찰하고 한참 대결하는 중이었죠. 최루탄에 투석으로 맞서고" 있을 때 소극적 참여자였던 권씨는 투석전 한 복판에서 참외를 실은 삼륜차의 전복 현장을 목격한다. “한 차분이나 되는 참외가 눈 깜짝할 새 동이 나버립디다. 진흙탕에 떨어진 것까지 주워서는 어적어적 깨물어 먹는 거예요" 이 장면은 작가적 상상력으로 나울 수 없는 것이다. 윤흥길이 직접 목격했을 것이다.
"그런 속에서도 그걸 다투어 주워먹도록 밑에서 떠받치는
그 무엇이 그저 무시무시하게 절실할 뿐이었죠.
이건 정말 나체화구나 하는 느낌이 처음으로 가슴에 팍 부딪쳐옵디다.
나체를 확인한 이상 그 사람들하곤 종류가 다르다고 주장해나온 근거가
별안간 흐려지는 기분이 듭디다.”
결국 권씨는 봉기를 주동한 혐의로 체포되어 전과자가 됐다. 본래 가졌던 변변치 않은 직장 마저도 전과자가 된 후 잘렸다. 경찰은 항상 그를 감시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권씨는 막노동, 심지어 강도짓까지 하려다가 어느날 아홉 켤레의 구두만 남긴채 사라졌다.
구두는 권씨가 다른 도시 빈민들과는 다르다는 자존심의 표시였을 것이다. 다른 빈민들은 고무신만으로 만족하던 시절, 선거철 마다 매표(買票)용으로 고무신이 뿌려지던 시절, 구두는 지성인 또는 중산층 이상을 상징하는 기표였다.
이재명은 1980년 성남으로 이사왔지만 성남의 슬픈 역사는 알고 있었을 터, 그는 아홉 켤레의 구두를 남긴채 사라지지지 않고 지금도 걸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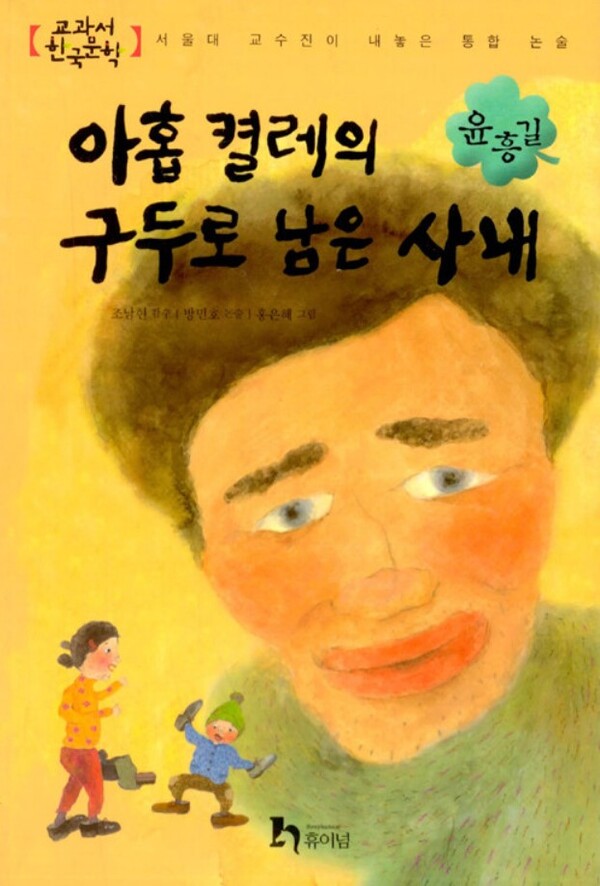
그 길은 성남의 언덕에서 시작됐다. 소년공 이재명의 첫 직장은 집 근처(성남 상대원동)의 목걸이를 만드는 이름 없는 가내수공업장이었다. 월급 1만원을 받고 황동선을 납과 염산으로 땜질했다. 1년쯤 다녔지만 사장의 야반도주로 세달치 월급을 떼였다. 지하방에서 형과 누이와 뒤엉켜 잠을 잤고, 고개 너머로 서울의 불빛을 올려다봤다. 그 빛이 유난히 멀었던 건, 거리 때문이 아니라 계급 때문이었다. 그의 첫 번째 신발(구두)은 배움 대신 굳은살로 교과서를 삼던 이의 발에 신긴 고무신이었을 것이다.
경북 출신이라는 지역적 타자성, 검정고시라는 제도 밖의 성취, 변호사라는 계단마저도 그에겐 도약이라기보다 생존이었다. 권씨는 아홉 켤레의 구두를 벗고 도망쳤지만, 그는 차곡차곡 쌓았다. 시민과 함께 걸을 길을 준비한 것이다.
성남시장 시절, 그는 두 번째 구두를 신었다. 이번엔 권 씨와는 다른 길을 걸었다. 권 씨는 대책위 위원장을 하다 끝내 사라졌지만, 이재명은 그 언덕 위에서 시장이 됐다. 그에게 권력은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고통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한 도구였다. 공공의료원 건립, 무상복지 확대, 전국 최초의 기본소득 실험. 그것은 거창한 이상이 아니라, 시장 골목을 걷던 그의 발에서 비롯된 ‘생활 정치’였다.
이재명이 지닌 세 번째 구두는 적의 흔적이 새겨져 있다. ‘형수 욕설’이라는 비수, ‘조폭 연루설’이라는 덫, ‘사법 리스크’라는 올가미.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를 지탱한 건 국민이 아니라, 시민이었다. 시민은 구두가 닳는 것을 보고 믿었다. 쇼윈도 정치가 아닌, 진창을 딛고 온 사람을.
2022년 대선, 그는 졌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날, 시민들은 이재명을 이겼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가 걸어온 길은 누구보다 명확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되지 않았지만, 대표가 됐다. 민주당의 대표가 아니라, 고단한 시민의 대표. 기성 진보가 놓친 삶의 언어를, 그는 구두로 말했다. 아홉 켤레의 구두는 그가 언젠가 될 ‘대통령’이라는 직함보다 더 깊은 정치의 무게였다.
이재명에게 대통령은 목적지가 아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이재명의 나라’를 말한 적이 없다. 그의 구두는 늘 “그들의 마을”, “그들의 골목”, “그들의 생존”을 향해 있었다. 아홉 켤레의 구두 중 넷째와 다섯째는 백현동과 대장동 논란 속에서 더러워졌고, 여섯째는 탄핵 정국 속 국민과 거리에서 닳았다. 일곱 번째 구두는 테러로 피가 묻었다. 그러나 여덟 번째는 병상에서 다시 꿰매졌다. 그는 기꺼이 다시 일어났고, 사람들은 그를 기다렸다.
마침내 대통령의 아홉 번째 구두를 신었다. 먼지와 피와 구호와 노동의 냄새가 배어 있는 구두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구두를 소유하기 위해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걸어가기 위해 정치를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윤흥길의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문학과 지성사, 1997, ‘창작과 비평’ 1977년 여름호에 처음으로 발표되었다)에서 권 씨는 구두를 남기고 사라졌다. 그가 감당하지 못한 것은 불의가 아니라, 절망이었다. 그러나 이재명은 다르다. 그는 구두를 남기지 않고, 계속 신는다. 구두는 기억이요, 경로이며, 연대다. 그는 취임식 후 국회 청소 노동자들을 처음 만났다. 그가 준비한 아홉 번째 구두는 그래서 ‘자기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꿰맨 것이다.